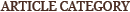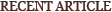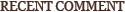내안의 기쁨의 공간
내 안에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의 공간이 들어 있다. 나 자신의 깊숙한 곳에는 밖으로부터 오는 모든 종류의 이해와 인정보다 훨씬 강한 생명력과 삶에 대한 애착이 들어 있다. 기쁨은 표출되고 싶어하는 에너지이고, 밖으로부터 오는 방해 요소보다 강한 에너지이다. 폭포수가 아래로 흘러가면서 주변의 자갈을 비롯한 모든 잡동사니들을 씻어 내리고 바위를 닳게 하여 변형시키듯이, 기쁨은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모두 쓸어 내려서 삶이 다시 힘차게 흐르도록 하는 생동적인 에너지이다. 기쁨은 자신을 가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쁨은 모든 종류의 방해요소를 극복하고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고 만다. - 안셀름 그륀 -
한동안 마치 봄을 건너뛴 천덕꾸러기같은 여름 날씨였지만, 이제 비로소 본 궤도를 찾은 듯 햇살 아래 선 저의 모습이 봄기운으로 밝아집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뜨거운 햇살이나 혹은 매서운 칼바람은 난로 앞에 앉아 수박을 우걱거리거나 선풍기 바람을 쬐며 귤 껍질을 열여 제끼는 것처럼, 입에서는 단맛과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웬지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 몸 전체가 아닌 혀끝에서만 맴도는 과일 맛은 불구의 미각에 머무는 것처럼 완연한 사계절은 단지 눈 앞에서 벌어지는 현상에서 나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 존재자들의 변화, 특별히 인간성의 회복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현상이 순서가 뒤바뀌거나 엉킨채로 돌아가는 모습은 요사이 모든 장르에서 한창 유행인 퓨전fusion적 현상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세상이 급속도로 끝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의 빈곤과 공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이 공허하면 우리의 행동도 공허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공허해지면 그와 관계하는 이들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모인 사회, 그 사회들이 모인 국가와 세계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채로 공허한 것을 탐닉하고 만족하는 현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기쁨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마음이 기쁘다는 것은 자극적인 외부적 현상에 의해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셀름 그륀이 우리 안에 아무도 해치거나 침범할 수 없는 [기쁨의 공간]이 있다 말했듯이, 그 공간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인위적인 공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 기쁨은 무엇이며, 그 기쁨이 있는 사람들에겐 어떤 삶이 가능할까요? 안셀름 그륀은 그것을 ‘폭포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파에 맞서 이겨낼 수 있는 참 기쁨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 흐르는 물줄기처럼, 번잡스레 자리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거짓 기쁨을 몰아내고 거듭 위선적 기쁨을 심고자 막아서는 돌맹이들을 자연스런 에너지로 쓸어내려 저 폭포 아래에 내리쌓이게 하는 현상과도 같습니다.
누구나 하염없이 흘러내릴 기쁨의 폭포가 자리하고 있는 공간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 기쁨이 아니면 참된 기쁨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외적 현상이 만들어 주는 기쁨은 도리어 참 기쁨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에 먹을 수 있는 수박은 혜택이요 진보라기 보다는 리듬을 깨는 어긋난 박자이며, 본 박자로 되돌아가야 하는 징조인 까닭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표출할 수 있는 맛은 세치혀에 국한된 기쁨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어 온 몸에 주어지는 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요 그 기쁨을 표출하고 전이시킬 대상일 것입니다. <2004.05.06>
내 안에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의 공간이 들어 있다. 나 자신의 깊숙한 곳에는 밖으로부터 오는 모든 종류의 이해와 인정보다 훨씬 강한 생명력과 삶에 대한 애착이 들어 있다. 기쁨은 표출되고 싶어하는 에너지이고, 밖으로부터 오는 방해 요소보다 강한 에너지이다. 폭포수가 아래로 흘러가면서 주변의 자갈을 비롯한 모든 잡동사니들을 씻어 내리고 바위를 닳게 하여 변형시키듯이, 기쁨은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모두 쓸어 내려서 삶이 다시 힘차게 흐르도록 하는 생동적인 에너지이다. 기쁨은 자신을 가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쁨은 모든 종류의 방해요소를 극복하고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고 만다. - 안셀름 그륀 -
한동안 마치 봄을 건너뛴 천덕꾸러기같은 여름 날씨였지만, 이제 비로소 본 궤도를 찾은 듯 햇살 아래 선 저의 모습이 봄기운으로 밝아집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뜨거운 햇살이나 혹은 매서운 칼바람은 난로 앞에 앉아 수박을 우걱거리거나 선풍기 바람을 쬐며 귤 껍질을 열여 제끼는 것처럼, 입에서는 단맛과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웬지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 몸 전체가 아닌 혀끝에서만 맴도는 과일 맛은 불구의 미각에 머무는 것처럼 완연한 사계절은 단지 눈 앞에서 벌어지는 현상에서 나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 존재자들의 변화, 특별히 인간성의 회복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현상이 순서가 뒤바뀌거나 엉킨채로 돌아가는 모습은 요사이 모든 장르에서 한창 유행인 퓨전fusion적 현상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세상이 급속도로 끝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의 빈곤과 공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이 공허하면 우리의 행동도 공허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공허해지면 그와 관계하는 이들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모인 사회, 그 사회들이 모인 국가와 세계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채로 공허한 것을 탐닉하고 만족하는 현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기쁨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마음이 기쁘다는 것은 자극적인 외부적 현상에 의해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셀름 그륀이 우리 안에 아무도 해치거나 침범할 수 없는 [기쁨의 공간]이 있다 말했듯이, 그 공간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인위적인 공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 기쁨은 무엇이며, 그 기쁨이 있는 사람들에겐 어떤 삶이 가능할까요? 안셀름 그륀은 그것을 ‘폭포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파에 맞서 이겨낼 수 있는 참 기쁨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 흐르는 물줄기처럼, 번잡스레 자리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거짓 기쁨을 몰아내고 거듭 위선적 기쁨을 심고자 막아서는 돌맹이들을 자연스런 에너지로 쓸어내려 저 폭포 아래에 내리쌓이게 하는 현상과도 같습니다.
누구나 하염없이 흘러내릴 기쁨의 폭포가 자리하고 있는 공간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 기쁨이 아니면 참된 기쁨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외적 현상이 만들어 주는 기쁨은 도리어 참 기쁨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에 먹을 수 있는 수박은 혜택이요 진보라기 보다는 리듬을 깨는 어긋난 박자이며, 본 박자로 되돌아가야 하는 징조인 까닭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표출할 수 있는 맛은 세치혀에 국한된 기쁨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어 온 몸에 주어지는 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요 그 기쁨을 표출하고 전이시킬 대상일 것입니다. <2004.05.06>
'Spiritual Writing2(2004-2007)'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밥 먹는 자식에게 (0) | 2012.03.22 |
|---|---|
| 그 나라는 맘의 나라다 (0) | 2012.03.22 |
| 인간으로 존재하라 (0) | 2012.03.22 |
| 창조주를 우러러 온전한 정신으로 (0) | 2012.03.22 |
| 소중한 일부터 (0) | 2012.03.22 |
인간으로 존재하라
우리의 존엄성은 우리의 뱃속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저 무한한 존재가 머무시는 성지聖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를 가두고 있는 구조물을 비판하고 부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우리가 우주에서 벗어나 높이 떠올라 저 창조적 존재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을 방해하는 거짓 자아를 우리 자신으로 여기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우리 스스로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인간이 존재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의 역사 한 가운데에 우리의 자유가 숨쉬는 저 무한의 공간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 모리스 젱델 -
인간이 존엄한 가장 명백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긴하나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분신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고서는 달리 어떻게 자신의 모습대로 지을 수 없어서 지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한사람 한사람 참 곱고도 귀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빚으시는 순간, 감격의 마음과 떨리는 손을 애써 가라앉히시며 정글디정근 사랑의 마음을 다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로써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그러나 과연 어디 인간의 모습이 존엄하다고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울까요? 속임과 술수, 거짓과 교만, 그리고 살인을 넘어 학살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그 끝을 다한 것인양, 드러낼 수 있는 극악한 행태를 모두다 꺼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신비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시시각각으로 급격해지고 있는 존엄성에의 도전은 종말을 예감토록 하곤 합니다.
어느 캄캄한 밤, 무섭도록 질주해 오는 죄책의 무게로 절망했던 적이 있습니까? 인생의 그릇된 판단과 실수로 인해서 자신을 학대하고 싶을 정도의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범하는 악한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의 판단, 나의 결정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래서 ‘나’로부터 나온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판단하고 결정했던 ‘나’라는 것은 온전한 ‘나’는 아닐 것입니다. 아니, 그 ‘나’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나’였을 것입니다. 아직 ‘나’조차도 잘 모르는 ‘나’가 행한 일들로 인해서 그저 상처받고 손놓고 비관하는 모습은 ‘거짓 나’에게 두 번 속아넘어가는 일입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우리 안에서 정당한 듯 보이도록 수런대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요, 훼손된 우리 자신을 방치하도록 꼬득이는 악한 존재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으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은 실존적 한계를 안고 있는 인간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을 이동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인간상의 포인트가 죄요 타락이요 절망이라면, 우리에게 가능성은 요원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리스 젱델의 말처럼 우리가 [저 무한한 존재가 머무시는 성지聖地]가 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바울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을 모시는 성소聖所]가 되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로소 초월의 가능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2004.05.03>
우리의 존엄성은 우리의 뱃속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저 무한한 존재가 머무시는 성지聖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를 가두고 있는 구조물을 비판하고 부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우리가 우주에서 벗어나 높이 떠올라 저 창조적 존재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을 방해하는 거짓 자아를 우리 자신으로 여기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우리 스스로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인간이 존재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의 역사 한 가운데에 우리의 자유가 숨쉬는 저 무한의 공간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 모리스 젱델 -
인간이 존엄한 가장 명백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긴하나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분신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고서는 달리 어떻게 자신의 모습대로 지을 수 없어서 지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한사람 한사람 참 곱고도 귀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빚으시는 순간, 감격의 마음과 떨리는 손을 애써 가라앉히시며 정글디정근 사랑의 마음을 다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로써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그러나 과연 어디 인간의 모습이 존엄하다고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울까요? 속임과 술수, 거짓과 교만, 그리고 살인을 넘어 학살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그 끝을 다한 것인양, 드러낼 수 있는 극악한 행태를 모두다 꺼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신비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시시각각으로 급격해지고 있는 존엄성에의 도전은 종말을 예감토록 하곤 합니다.
어느 캄캄한 밤, 무섭도록 질주해 오는 죄책의 무게로 절망했던 적이 있습니까? 인생의 그릇된 판단과 실수로 인해서 자신을 학대하고 싶을 정도의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범하는 악한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의 판단, 나의 결정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래서 ‘나’로부터 나온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판단하고 결정했던 ‘나’라는 것은 온전한 ‘나’는 아닐 것입니다. 아니, 그 ‘나’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나’였을 것입니다. 아직 ‘나’조차도 잘 모르는 ‘나’가 행한 일들로 인해서 그저 상처받고 손놓고 비관하는 모습은 ‘거짓 나’에게 두 번 속아넘어가는 일입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우리 안에서 정당한 듯 보이도록 수런대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요, 훼손된 우리 자신을 방치하도록 꼬득이는 악한 존재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으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은 실존적 한계를 안고 있는 인간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을 이동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인간상의 포인트가 죄요 타락이요 절망이라면, 우리에게 가능성은 요원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리스 젱델의 말처럼 우리가 [저 무한한 존재가 머무시는 성지聖地]가 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바울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을 모시는 성소聖所]가 되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로소 초월의 가능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2004.05.03>
'Spiritual Writing2(2004-2007)'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그 나라는 맘의 나라다 (0) | 2012.03.22 |
|---|---|
| 내안의 기쁨의 공간 (0) | 2012.03.22 |
| 창조주를 우러러 온전한 정신으로 (0) | 2012.03.22 |
| 소중한 일부터 (0) | 2012.03.22 |
| 교회 공동체의 기반 (0) | 2012.03.22 |
 Prev
Pre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