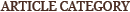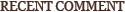이면우의 시집 중에 <아무도 울지 않는 밤은 없다>가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나온 그의 시집이어서 한 줄 한 줄 놓치고 싶지 않은 맘으로 읽어내려갔는데요, 그가 전업 시인이 아닌 보일러 수리 기사인 것이 이번엔 참 다행이었습니다. 어쩌면 생업을 위해 이리 저리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훑고 다닌 시간이 있었기에, 언어가 생경하지 않고 현장이 고스란히 뭍어 있는 낱말들이 아니었나 합니다.
그는 나이를 먹어 가는 것을 두고 '낡아가며 새로워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생물학적 변화를 막을 수 없고, 그래서 누구나 낡아질 수밖에 없는 공평한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낡아지며 더욱 더 구닥달이가 되고, 낡아지기만 한 게 아니라 좁아지고 얕아지는데, 그는 새로워지고 있다 감히 말하고 있네요.
누가 인증을 해줄 것을 바라고 쓴 싯귀는 아니었겠지만, 그의 눈에 들어 온 '낡은 짐짝처럼 귀퉁이에 잊어진 노파'를 향한 시선, '사랑하는 이들에게 뻗는 저녁길엔 지름길이 없다'며 함께 읽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마음도 잊지 않고 있기에......
한편, 서쪽 바다 너머로 고개를 쳐박는 해를 두고 '세상에서 제일 큰 붉은 마침표'라며 해거름의 심상을 공책 가득 꽉 채워 두고 있기기도 하기에......
그리고 이 시집의 제목처럼, 한 밤을 헤짚고 다니며 입증할 까닭도 없었으면서도 <아무도 울지 않는 밤은 없다>는 선언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저홀로 편편한 세상, 마냥 이죽거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며 짐짓 고시해 주고 있기에, 그는 연대기로 가둘 수 없는 한 자유로운 영혼이자, 혼탁함 속에 한 밤의 고즈넉함을 아는 날로 새로워지는 인간인 듯 부럽기만 합니다.
'생을 축음기에 얹어 되돌린다면
바늘이 가볍게 긁어내는 슬픔이 강처럼 흘러올 것이다."
- 이면우, "물에 잠긴 스와니강"에서
'Etched in my mind' 카테고리의 다른 글
| Looking for another forsythia in desert. (0) | 2012.05.13 |
|---|---|
| 사막의 꽃 (0) | 2011.06.05 |
| 가끔씩 뿌듯해지네 (0) | 2011.06.05 |
| 스티브 바라캇 그리고 통일 (0) | 2011.05.15 |
| 사막의 봄 (0) | 2011.05.08 |
Hit or miss is not going to get us
where we need to be.
If we just continue to doing like that,
even it is of some value,
it will boild down to nothing, chaos.
'Every Single Moment(1999-2007)'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3년 10월의 정국 (0) | 2013.11.01 |
|---|---|
| In memory of paper NEWSWEEK magazine. (0) | 2012.10.19 |
| 이은미 - 좋은사람 (0) | 2012.05.13 |
|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쁨 (0) | 2012.05.13 |
| 방금 걸려 온 전화를 받고 (0) | 2012.05.13 |
 Prev
Prev